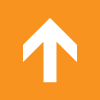나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왔다. 매일 울려 퍼지는 폭격 소리, 집을 잃고 흩어진 가족과 이웃들, 끝없이 이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은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 나에게 최근의 한 경험, 바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방문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곳에서 나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북한 군인을 마주했다. 무거운 군복 속 땀에 젖은 채, 긴장한 얼굴로 총을 움켜쥔 그의 모습은 묵직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반면 나는 하얀 치마를 입고 차가운 커피를 손에 든 채 자유롭게 서 있었다.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났지만, 우리의 삶은 극명하게 달랐다. 나는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누렸지만,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비무장지대 인근의 아파트 단지는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침공 시 폭파되도록 설계된 건물’이라는 안내자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곳의 건축물과 일상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속엔 전쟁 대비라는 냉혹한 논리가 스며 있었다. 몇 구역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하루를 버티고, 또 누군가는 너무 바빠서 혹은 무관심해서 이 현실을 외면한다. 사실, 우리는 고통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대개 그것을 외면한다.
박물관에서 본 금속 세면대, 배급 카드, 빳빳한 교복은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생활 도구였지만, 나에게는 소련 시절 조부모님이 사용하던 물건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소련은 과거의 역사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현재의 삶이다. 그 체제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저항을 포기하게 하며, 그저 조용히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다.
북한의 삶은 단순히 물자가 부족한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침묵, 그리고 철저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북한을 ‘미사일’, ‘군사 퍼레이드’, ‘협상’이라는 뉴스 속 단어로만 접한다. 그러나 내가 본 그 군인의 눈빛, 박물관 속 낡은 생활용품은 그 너머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견디기 위한 삶.
우리는 같은 태양 아래 숨 쉬지만, 한 사람은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군복을 입은 채 침묵 속에 남는다. 전쟁의 상흔은 총성이 멈춘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에 깊게 남아 세대를 건너 이어진다. 한반도 역시 전쟁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진 채,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나는 우크라이나 청년으로서, 그리고 전쟁을 직접 겪은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전쟁일지라도, 그것이 멀리 떨어진 땅의 이야기일지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은 평화의 출발점이 된다.
같은 태양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희망이야말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미래다.
< 저작권자 ⓒ 한반도프레스(KPP).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중민 기자 ( kppress ) 다른글 보기 kppress01@gmail.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
비회원 접속중